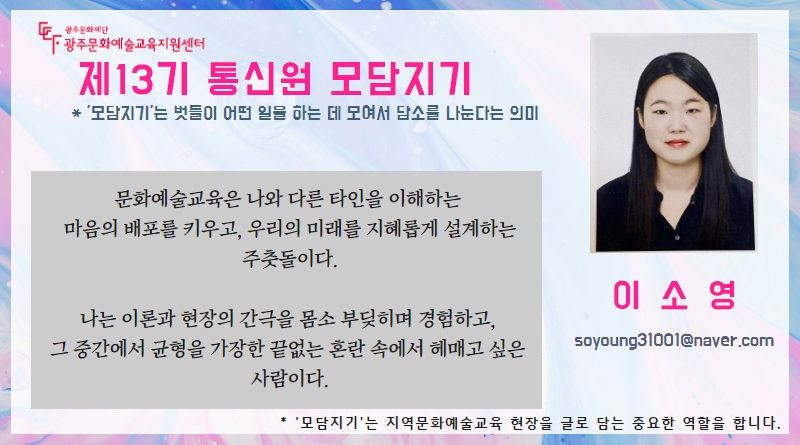- 사진선택.jpg [size : 460.8 KB] [다운로드 : 48]
능동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발걸음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취재 : 이소영(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 김옥진(‘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랩장&마음놀이터 대표)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나.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결과중심주의’와 ‘성과중심주의’에 피로와 염증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덕분에 해방 이후 빠르게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관행이 불러온 역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성패를 판단하는 데 좋지만, 과정이라는 시공이 없다면 좋은 결과물은 아예 나올 수 없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자기 경험을 타인과 나누며 깊이 사유하는 단계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김옥진 랩장과 인터뷰하면서 반추해 보았다.
Q1.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에 대하여
도시 가로수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냥 나무일뿐이던 가로수가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싶었다. 우리 연구실에는 사진·영상·디자인·시각예술 전문가가 있는데, 어떻게 주제를 더 심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도시 생명체들이 어찌 살아가는지 보기로 했다. 비둘기, 참새 등 하나로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여러 생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되어보기’로 도시 속 다양한 생명체에 접근했다. ‘동식물은 도시에서 살기 힘들다’며 표피만 보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비둘기라면 어떨까?, 광주천에서 살고 있다면 어떨까?’ 등 여러 시선에서 보려고 한다. 하지만 마음먹는다고 바로 그것이 될 수는 없어서 생명과 관련해 연구보고서, 문학, 에세이 등을 찾아 읽으며 배우는 중이다.


Q2. 사진·영상·디자인·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어떻게 어울리며, 새롭게 발견한 것들
미디어 작가는 비둘기를 사람에 비유해서 작업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비둘기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비주류라고 분류하면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둘기를 비유했다. 그리고 새의 눈이 양쪽 끄트머리에 달려있듯이, 사진작가는 양쪽 끝에 렌즈가 있는 카메라로 도시를 촬영하기도 했다. 우리의 시선과 달리 ‘새는 도시를 이렇게 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Q3. 언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즈음 만나 도시를 함께 돌아다니며 새로운 생명체를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새롭게 발견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때는 생명에만 국한해 말하진 않는다. 도시라는 공간에 있는 것들은 인간에게 쓸모가 있느냐와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하다못해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하지 않나. 고속도로 주변이나 아파트 사이사이 조그만 땅이라든지…… 쓸모를 다했다고 버려진 것들이 눈에 띄더라.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Q4. 어렵거나 힘든 점
솔직히 딱히 없다(웃음). 연구원들이 모두 각 분야 전문가이고 소신 있게 작업하고 있다. ‘창의예술교육 Lab’은 결과 보다 과정이 중요하니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찾고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둘씩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좋은 문화예술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말이다. 좌충우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고 궁리하니 재밌다. 즐겁게 하려 한다.
Q5. 김옥진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그동안 비슷하게 정형화됐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대상으로 프로그램하고, 끝나면 그대로 끝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일상에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없다. ‘창의문화예술교육 Lab’처럼,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모여 스스로 방법을 찾아 공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바뀌면 좋겠다. 틀 안에 딱딱하게 굳은 문화예술교육에 금이 가길 바란다.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하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이 한 번의 짧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를 찾은 듯했다. 관심 있는 주제로 연구하고 여러 관점을 공유하는 중요성.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다 보면 새로운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체험형을 넘어서,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연구형 혹은 인문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은 광주센터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22.11월 ~ '23. 2월)
'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 질문에서 시작해 정말 광주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랩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장르(농부, 기획자, 작가, 사진가 등)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해 주제별 스터디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제별 4~8명씩, 총 6개 랩 44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오는 2월에는 6개랩 과정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 자리가 마련될 계획이다.
향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하는게 목표다
[6개 랩 주제]
시민걸음 탐구(랩장 오주현 포함 연구진 8명)
광주를 놀이터로(랩장 이호동 포함 연구진 8명)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랩장 김옥진 포함 연구진 8명)
요리와 이야기(랩장 김진아 포함 연구진 8명)
광주 안의 타자(랩장 오은영 포함 연구진 4명)
시민행동을 예술프로젝트로(랩장 추말숙 포함 연구진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