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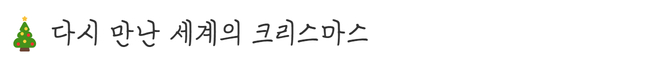
"안녕하냐"라는, 흔하디흔하고 쉽디쉬운 한 마디가 다르게 들리는 2024년 12월입니다. 까딱하면 안녕하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모두가 그럴 뻔했지요. 이번 달 편지를 쓰려고 채성태 님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 사는 친구가, 오일팔 때 광주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지 알겠다 하더라고." 나쁜 일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뭣이 중요한지 번쩍하고 알게 하니까요. 자는 곳, 먹고 입는 것, 하는 일 모두 선명하게 그대로지만 우리의 세계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의 배경음악이 된 "다시 만난 세계"가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후 우왕좌왕 안절부절못하는 중에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 이것은 두 가지 뜻일 겁니다. 광장에 모여 높은 목소리로 가치를 외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일상을 지키자는 선언이겠지요. 그래서 귀가 팔랑이고 엉덩이가 들썩일 때마다 저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집니다. 그렇게 새벽 다섯 시에 책상 앞에 앉아 올해 마지막 뜬구름 편지를 씁니다. 남 좋은 일 좀 해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꾸역꾸역 한 해를 살아낸 당신을 떠올립니다. 나누고 싶어 안달하는 희한한 당신들을.
'저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다가 쉬고 있다는데, 우리 목공방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하면 어떨까.'
'하릴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 사진관에 오라고 해서 사진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소아암 치료를 끝낸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 가서 동화를 함께 써보면 어떨까.'
'외따로이 살아가는 청년 예술가들이랑 같이 푸성귀 키워 밥 지어 먹고 일기도 같이 쓰면 어떨까.'
'아픈 형제를 둔 어린이들은 때때로 얼마나 외로울까. 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도우면 어떨까.'
'아, 자꾸 저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또 어떨까. 그냥 한 번 해보자. 어라, 내 생각이 맞았네. 이게 되네. 그럼 다음엔 이것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일 년, 삼 년, 오래오래 발바닥에 땀 나도록 남 좋은 일 해온 당신을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올해도 남 좋은 일로
나를 좋게 가꾸어낸 당신에게
다시 만난 세계에서 인사를 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