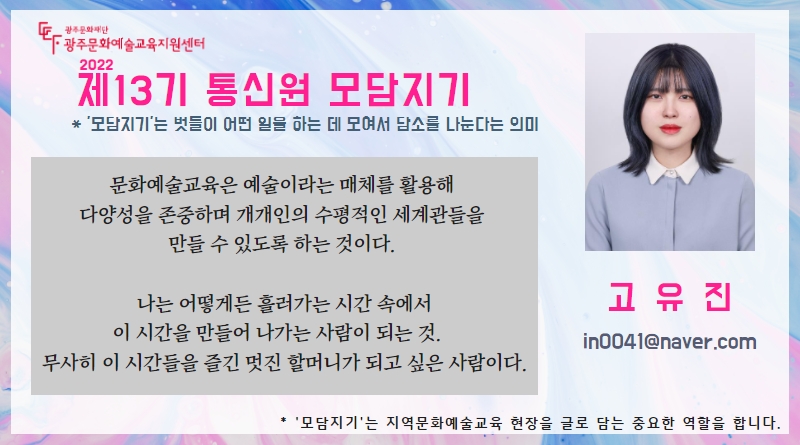- 사진5.jpg [size : 81.9 KB] [다운로드 : 50]
우리 선생님은 화가
<자연에서 모내기하며 수업하는 작가 박문종>
취재 : 고유진(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 박문종 작가
2022년만큼 n잡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딱 십 년 동안 n잡하며 살아온 작가가 있다. 〈우리 선생님은 화가〉의 주인공 박문종 작가를 만나기 위해 담양 수북에 있는 작업실로 떠났다.

▲ 뜨거운 햇빛과 매미 소리, 물감들이 빼곡한 작업실에서 박문종 작가
우연히 특강을 들었는데 수업 중에 모내기한대서 놀랐어요.
담양 살면서 자연과 어떻게 놀고 어떻게 작업할까 좀 고민했어요. 2008년에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어 작업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고민하다가 모내기라는 형태가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고 2012년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북구문화의집에서 〈땅과 예술〉이라는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이들한테 놀면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같이 어려운 일이 또 없어요. 주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들고 밖으로 나온 자체로 성공했다고 봐요. 하지만 또 그다음이 문제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자기 나름의 시선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가 문제죠. 아이들마다 접근하는 법이 다르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오히려 환경을 갖추기는 쉬울 수 있어요.

▲ 2012년 모내기 퍼포먼스의 시작(북구문화의집 제공)

▲ 저는 아이들하고 놀이를 통해 만나요(북구문화의집 제공)
환경을 제공하기 쉬워도 수업을 이끌기는 어려운가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은 짧아요. 수업은 겨우 두 시간인데 여기서 집중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면 끝나요(웃음). 30분 넘게 집중하는 날에는 속으로 ‘잘됐군! 대박이다.’라고 외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놀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자 하죠. 간단하지 않죠. 머릿속에 이미 어떤 풍경이 들어와서 물감으로 바로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손을 못 대는 아이도 있고 알아먹을 수 없을 만큼 작품이 난해하기도 해요. 같은 나이여도 천차만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미술의 어려움이기도 매력이기도 해요. 이때 집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놀이예요.


▲흙 위 그리고 한지 위에 먹으로 선을 그려 본다
여름날에는 물 달리기를 해요. 물 달리기는 그림으로 보면 선긋기 같은 것이죠. 2L 페트병을 들고 공터에서 100미터 경주 라인을 그어 놓고 병 속 물을 길게 흘리며 가는 일종의 시합인데, 굵든지 짧든지 길게 가야 해요. 선을 길게 이으며 달리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끊기지 않도록 애쓰면서 힘의 균형을 신경 쓰다 보면 아이들도 이 놀이가 간단하지 않다고 깨닫죠. 그리고 이걸 미술 수업으로 가져와요. 여러 행위 속에 미술 요소를 자꾸 넣어서 아이들과 같이해요.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하게 되었을까요?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업하고 전시하는 터줏대감이었어요. 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이 대인시장 예술 감독이었고, 그렇게 북구문화의집 수업을 자연스레 시작했어요. 2012년 6월에 담양 동네 논을 빌렸고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모내기를 했어요. 어린 모를 물에다 심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모내기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접점 같았어요.
모내기가 인간과 자연의 접점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같이 물에서, 진흙탕에서 들어가 논다는 것이 흥미로워요. 논에 들어가면 살에 닿는 감촉이 묘하잖아요? 싫다고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 좋아해요. 이렇게들 좋아하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되겠다 싶었어요. 무엇을 그릴 것인가 생각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장치로서 자연을 구심점으로 삼았지요.

▲지역작가 초대전 『이상적인 찰나』 part1. 박문종 〈나는 땅에서 났다〉 전시작(담양문화재단-담빛예술창고 제공)
자연과 함께하는 수업은 작업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듯해요.
1970년대부터 그림을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조선시대의 농경문화와 농경도에 대해 논문을 썼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웠어요. 논문을 쓰고 담양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농촌 풍경이 아니고 경작지, 그중에서도 밭 말고 논으로 좁혀 갔어요. 남도의 서정적인 정서가 담긴... 토속적, 향토적인 정서가 담긴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작업을 수업에 녹여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실마리를 찾을 때도 있는데, 그들은 과감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바로 해요. 그 작은 손으로 그리는데 진짜 에너지를 느껴요. 작가들은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점 하나 찍으려고 몇 번을 지웠다가 말았다가 하거든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주저 없이 작업해야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생각하죠. 제가 아이들을 보고 배우듯이 아이들도 제 기법을 알게 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죠.
요즘 ‘예술가 교사’라는 말을 쓰지요. 예술가와 교육자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저를 교육자로 보기는 어렵죠. 예술하고 있으니까 그냥 작가라고 생각해요. 수업은 창작이라는 아주 기본 틀을 갖고 있어요. 예술도 창작이 기반이고요. 창작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예술교육에 관심을 두겠죠. 제가 하는 예술이 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한 장에 그려요(북구문화의집 제공)
비 올 때는 밖에 나가서 그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지요. 저는 일부러 비 오는 날 큰 한지를 챙기고 일회용 우비 입고 아이들이랑 나가요. 아이들의 상식은 어른들과 달라서 비 오는데 왜 내가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지는 서양의 캔트지와 다르게 직조성이 있어서 비를 맞고 풀어져도 신축성이 있어요. 수묵화는 물을 가지고 하는 그림이라 종이가 젖어도 그릴 수 있고요. 큰 한지를 펼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려 놓고 보면 빗물에 그림이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재밌죠. 애초 아이가 의도했던 그림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리니까 더 재밌네’라며 이해하는 폭을 넓혀요. 이들을 예상 밖으로 이끌 수 있으니 재밌죠.
보편적으로 스케치북 가지고 나가서 풍경 하나씩 그려오는 것도 미술이에요. 어떤 수업이 더 우수하냐는 수업 내용에 있지 않아요.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고 표현을 해냈느냐에 달려있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장치를 두는 일이 교육자의 임무이고, 교육자 스스로 이야깃거리를 계속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정이랑 결과가 다 재미있어야 아이들이 집중해요. ‘뭘 그릴까’하는 고민에서 더 발전할 수 있게 교육자들이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떠들면서 “어떤 게 괜찮나”, “이게 산이 높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강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조잘거리면서 자꾸 말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말해줘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요즘엔 미술 치료도 있고, 교수법도 다양하다지만 전 잘 몰라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 나눌 뿐이죠.

▲꽃무늬 농사 모자와 낫, 붓과 물감이 있는 곳에서
꽃무늬 농사 모자와 낫, 붓과 물감이 있는 곳에서 박문종 작가와 만났다. 자연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며 작업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지역작가 초대전 『이상적인 찰나』 part1. 박문종 〈나는 땅에서 났다〉(10월 2일까지)의 전시 소식을 전하며 꼭 가보길 추천한다. 우리 선생님은 화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