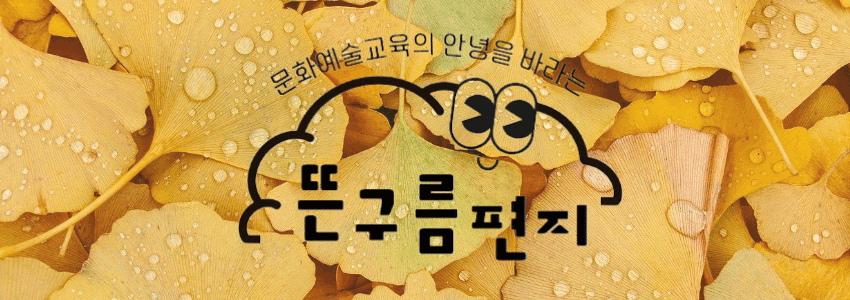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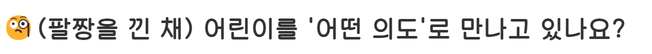
아들 이야기로 글을 연다. 학교 가기 십오 분 전, 아침밥을 차려놓은 식탁에 앉으며 아홉 살 아들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오늘 아침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도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와 말투였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심사위원을 따라 하고 있었다. "곰탕이 곰탕이지, 뭐."라며 코웃음 치며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돌이켜보면 의도하였다.
'엊저녁은 빵으로 때웠고 오늘은 쌀쌀하니까 아침에 뜨끈하게 밥을 먹이자. 아이들은 늦게 일어나 허둥댈 게 뻔하니 한 번에 후루룩 먹고 가게 곰탕을 데워서 밥을 말자.' 나는 고객의 뱃속과 바깥 기온과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 최적의 식단을 짠 것이다.
"흑백요리사"에서 요리사들은 자기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맛, 향, 질감, 온도, 플레이팅 등을 받아들일 때 기가 막히게 행복해했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가 그렇지 않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그럴 것이다. 한낱 아침 밥상에도 뜻이 있는데, 공들여하는 일은 오죽할까.
시 월 편지에서는 어린 세대를 공들여 만나는 이들을 소개한다. 어린 세대를 만나는 어른들은 유난히 지고지순해 보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묵묵히 자기 것과 곁을 준다. 집에 있는 부모나 교실에 서있는 선생님과는 다른, 제3의 어른으로서 (종종 진이 다 빠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의도로 어린 존재를 만날까.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을까. 견주느라 바쁘고 내세우느라 힘쓰는 세상에서 무사히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 남루하고 지루한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것을 기어코 찾아내도록 돕고픈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숲에 가고, 무대에서 연기와 연주를 하고, 바닥이 꽉 차도록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 어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집요하게 쓰는 걸까.
광주에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세 곳을 굽이굽이 찾아다닌 고무신학교 조재경 대표, 토요일 아침마다 어린이들과 분적산을 오르는 느티나무 탐험대 정미정 대표, "불쌍하다"는 무책임한 위로로 퉁칠 수 없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이야기한 김애란 소설가와 강지나 선생님에게 우리는 기필코 어린 존재들을 인정하려는 어떤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숨은 뜻을 응원할 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