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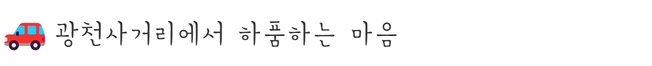
광천사거리에서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리면서 도대체 이 길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 생각했다. 뉴스와 광고를 틀어두는 집채만 한 전광판, 커다란 눈알이 그려진 안과병원 간판, 나 좀 알아달라고 펄럭이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세상에서 가장 큰 택배 상자처럼 생긴 백화점. 변하지 않는 시시한 풍경에 시비를 걸다 보니 애꿎게도 나까지 불똥이 튀었다. '내 삶도 앞으로 거기서 거기겠지.'
다시 액셀을 밟아서 풍암동에 있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로 향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삼십 대쯤 되었을까. 서서히 시력을 잃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미 씨가 무심한 표정으로 늘어놓는 진심을 들었다. 코까지 덮는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을 구경하는 스노클링을 좋아한다고 했고 미술관도 종종 간다고 했다. 남편이 말리지만, 클럽에서 춤추는 게 소원이라고도 했다. 그렇다고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딛고 도전하는 위대한 현미 씨'라며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그녀를 정의하고 싶진 않았다.
볼 수 있고 아니고, 장애가 있고 없고는 그날 모인 우리 사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고요한 포효에 반했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지만 요것도 하고 싶고 죠것도 하고 싶다는 수다 끝에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현미 씨는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만 세울 수 있다는 선언이 새삼스레 놀라웠다.
몸과 몸 밖의 조건 보다 나의 의지에 먼저 귀 기울이며 산다면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문화예술교육은 어쩌면 집요하게 말을 걸면서 한 사람의 자유 의지가 기어이 빛을 보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나는 십일월의 뜬구름 편지에서 소개된 허니펀치의 양동준,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정재일, 광산농악보존회의 한석중, 러브앤프리의 윤샛별, 그리고 그들이 만나고 읽어낸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만가지 빛깔의 자유 의지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광천사거리에 멈춰 섰다. 별 다르지 않은 가운데 새롭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가로지르는 작고 큰 사람들이, 그리고 달뜬 얼굴로 "안 하는 것은 못 하는 것과 다른 거야, 암 그렇고 말고."라고 중얼거리는 내가 별나 새로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