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진2.png [size : 256.0 KB] [다운로드 : 64]
김옥진(마음놀이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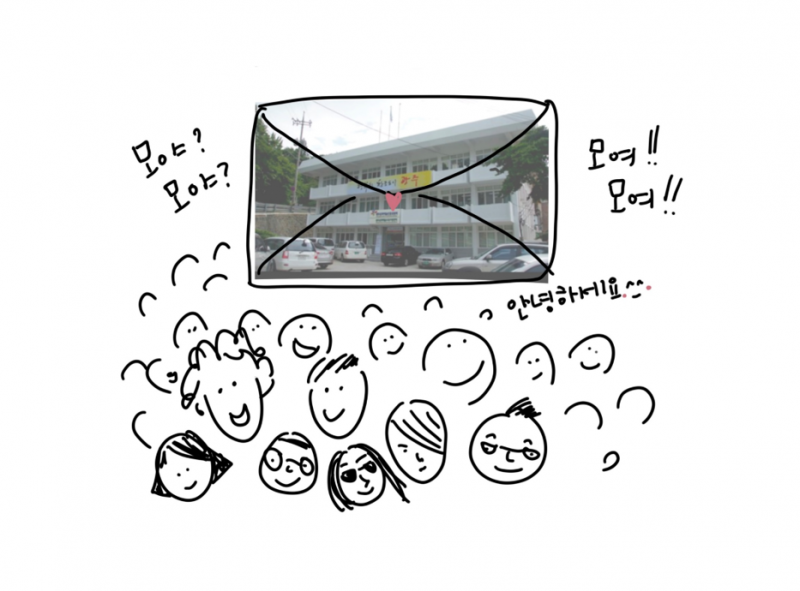
_라떼는 말이야
15년 전 이야기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배우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만났다.
삶의 무게가 버거운 그녀들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건만 그녀들은 별 의미를 둔 것 같지는 않았다.
인생 선배로서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만 해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었기에 존재하지만 실체가 느껴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사회와 소통을 넓히는 데, 문화예술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갈 즈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문화예술기획자, 예술강사들은 사직골 센터로 모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다. 우리의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했던 여러 프로젝트는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아있다. 그때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진행한다 해도 그때 그 감정에 젖어들 것이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장르와 사업을 넘어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_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먼저 ‘나는 행복한가?’
멈추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자신의 삶과 일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업적 기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내 경험에서 출발한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각자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기획과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 던진 질문들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준다.
올해 처음 시작한 참여자가 “선생님은 왜 그림을 안 가르쳐줘요?” 하는 물음에 여러 해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시던 어르신이 툭 던지듯 하신 말씀,
“여그는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꺼내는 곳이여”
결과 전시를 준비하며 다 같이 작품 디스플레이를 하는 날 참여자 중 한 분이 식사를 다 준비해오셨다.
“우리들 일로 선생님들이 애쓰신디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야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사업은 대상에 대한 연구기간과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프로그램 기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리서치를 하고 예술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여러 방식의 분석이 가능했다. 이 시간을 담보한 프로그램으로 만난 참여자들의 또 다른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이 아이들이 특별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거야?”
“둘 다”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수의 인원과 그 어떤 프레임 없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남긴 결과물이었다.
십 년을 훌쩍 넘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일인지 안다면 나는 그 전의 나와 다를 것이다.
_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공동체로
각자도생은 힘들다. 응원과 연대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잘했다고 나의 어깨를 툭 쳐주는 친구,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같이 걸어줄 친구, 먼저 경험해본 친구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판을 깔아주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리한 눈으로 예산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함을 채우려는 눈썰미가 필요한 곳이다. 라떼는 말이야 시절의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했었다. 서로의 신뢰와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역할을 기대해볼 만하다.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며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재미난 네트워크 파티가 열리고 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비 온 뒤 땅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지원센터 자체의 기획과 연구사업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낮은 문턱을 넘어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지속성을 담보하여 연차별 목표를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획사업, 광주만의 특색을 펼쳐낼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심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2021 광주문화예술교육포럼 발제문 '그 판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내기 위해' 내용 발취
